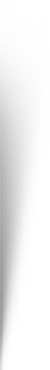시어(詩魚) 잡는 어부, 신(神)의 꽃을 탐하나?
―이선식의 『귀를 씻다』
시인수첩 시인선 41번째 책이자 2020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선식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귀를 씻다』가 출간되었다. 199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여 12년 만에 출간한 첫 시집 『시간의 목축』(2011)에 이어 다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시집을 엮게 되었다.
첫 시집에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줬다면, 이번 두 번째 시집에서 시인은 시의 원형을 찾아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을 시도한다. 이선식 시인에 따르면 꽃은 신(神)들이 쓴 시(詩)이며, 신이 신발을 신고 간 바람에 맨발로 꽃들을 밟고 절며 절며 걸어와 몇 날 며칠 꽃불 난 발을 앓은 시인의 걸음에서 피어난 것이 바로 속세의 시다.
이선식 시인은 드문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키리조트 설계사다. 19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렸던 전북 무주의 경기장과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의 다운힐경기장 모두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20여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접고 5년 전에 고향인 강원도 양구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으며, 허름한 농가 한 채를 리모델링하는 데 3년째 혼자 매달려 쩔쩔매고 있다. 난다 긴다 했던 건축설계사지만 정작 자신만을 위한 작은 공간이어서 손이 느리고 더욱 마음이 쓰인다고 한다. 아직도 마무리가 끝나지 않은 이 집의 이름이 바로 ‘세이헌(洗耳軒)’이다. 귀를 씻는 집, 시집의 제목도 이 이름을 따라 막판에 바뀌었다.
시인은 고향에 내려가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굽고, 클래식 기타도 연주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시를 쓰기 위한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려는 훈련이라는 것이다. 시를 위해 삶을 꾸려 가는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집 작품 전체에서도 이선식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경건성과 진성성이 잔뜩 묻어난다.
‘신’과 ‘사랑’과 ‘편지’라는 시의 기원을 찾아서
하늘의 신이 빛이라 불리는 투명한 작대기로
“눈을 감아도 그리운 얼굴이 명멸하여
수백 페이지 불면의 밤은 한 권의 서책이 되었소
그대 집 앞
은하수 건너는 나무다리 난간 위에 올려놓았으니
가져가 심심한 날 펼쳐 보시오”
라고 대지 위에 끄적거려 놓았다고 한다
우린 그 연서를 꽃이라 부른다
꽃은 신(神)들의 시(詩)이다
속계의 어느 시인이 봄산에 올라
여간해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시어(詩魚)*를 찾아
꽃 포기를 뒤적거리다가
신발을 벗어 놓고 그만 잠이 들었다
그때 마침 붓을 들고 시를 써 내려가던 신이
꽃잎 가마 같은 물건을 발견하고
슬쩍 발을 넣어 보았다
넣어 보니 구름 신발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
그냥 신고 가 버렸다지
맨발이 된 시인은 꽃들을 밟고 절며 절며
마을로 내려와 몇 날 며칠 꽃불 난 발을 앓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의 걸음걸음마다
백치의 시가 피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죽은 시어(詩語) 말고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시어(詩魚).
―「신화(神話)」 전문
시 「신화(神話)」에서 ‘꽃은 신들이 투명한 작대기로 땅 위에 끄적거린 연서’라는 표현은 시인이 꽃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다. 시인은 이 시에서뿐만 아니라 시집의 여러 작품에서 꽃을 신성한 위치로 떠받들고 있다. “봄눈 녹듯 세상의 채무도 사라지는” 희망의 날은 “꽃피는 봄날”(「하루」)이고, 광부에게 꽃은 “해마다 단 한 번 허락된 등불”(「나무와 광부(鑛夫)」)이며, 노모는 “꽃밭을 보며 열여섯인 듯 스무 살인 듯 다시 환해지는 꽃”(「꽃을 심는 이유」)에 비유된다. 시 「나무와 봄비」에서 꽃은 “모시러 가”야 하는 대상이며, 「적멸(寂滅)」이란 시에서 꽃은 스스로 어떤 의미도 되지 않겠다 선언하기도 한다. 시집의 해설을 쓴 소설가 이승우는 이 선언을 “어떤 의미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는 역설이라고 설명한다.
신이 대지 위에 끄적거린 사랑 편지가 꽃이고 시가 이데아인 꽃을 모방한 것이라면, 시의 기원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다시 말해 신의 영역에 있다. 꽃을 피우는 데, 즉 시를 쓰는 데 필요한 것은 ‘신’과 ‘사랑’과 ‘편지’다. 이는 지상의 모든 시가 꽃을 이루는 3요소인 신과 사랑과 편지를 떠나서는 쓰일 수 없다는 암시와 같다. 적어도 이선식 시인은 그렇게 믿고 있으며, 그만큼 시를 신성시하는 시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시어(詩魚)를 기다리며
『시인수첩』 2020년 겨울호에 실린 ‘시론 에세이’에서 이선식 시인은 궁극적인 시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비문학적 연습을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시어(詩魚)’ 만드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신화」의 주석에서 “죽은 시어(詩語) 말고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시어(詩魚)”라고 언급했듯이 시인은 ‘시어(詩魚)’가 초월적인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과 짐작으로 그 형상을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시초문의 시어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된다고 고백한다. 시인에게 시를 이루는 시어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보기도 얻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문장채집」이라는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속초 북쪽 바닷가에 문장채집을 나갔다가
뒷골목 초라한 난전에서 만난 좌판 바구니에
매혹적인 꼬리만 살짝 보이는 문장을 발견하고
노파에게 물었다
그 문장은 얼마요?
이것은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오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어찌해야 얻을 수 있단 말이오?
이 영물은 자신이 숨 쉴 곳을 스스로 안다오
곤한 잠의 어둑새벽 소리 없는 부름을 듣는 혼의 촉이라든가
마음이란 연못에 살다 떠난 물고기가 그려 놓은 영선(泳線)을 보는 눈과
별들의 독백을 청음할 수 있는 귀를 동시에 가진
선험이 성립되는 순간 시공을 초월해 그곳에 나타난다오
그 순간은 아주 짧아서 별이 눈 깜박하는 찰나의 섬광 같은 것이라오
준비되지 않은 이는 알 수도 없거니와 놓치기 일쑤지요
―「문장채집」 부분
‘문장’을 채집하기 위해 속초 북쪽 바닷가로 간 화자는 “뒷골목 초라한 난전에서 만난 좌판 바구니에/매혹적인 꼬리만 살짝 보이는 문장”을 발견하고 이 신비한 존재인 ‘문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묻는다. 그러자 “이 영물은 자신이 숨 쉴 곳을 스스로 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시어’와 ‘문장’을 보기 어렵고 채집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것의 존재 방식은 변화무쌍, 예측불허다. 게다가 시어와 문장은 채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숨 쉴 곳을 알고 찾아온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어와 문장을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숨 쉴 곳을 스스로” 알고 찾아오는 문장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즉 문장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가 시인이다. “별들의 독백을 청음할 수 있는 귀”, “마음이란 연못에 살다 떠난 물고기가 그려 놓은 영선(泳線)을 보는 눈”, “곤한 잠의 어둑 새벽 소리 없는 부름을 듣는 혼의 촉”이 바로 이선식 시인이 제시하는 준비 목록이다.
눈과 귀와 촉감으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신의 감각이 촉발하는 건 “별이 눈 깜박하는 찰나의 섬광 같은” 순간뿐이다. 이선식 시인은 시어와 문장이 찾아오는 순간을 찰나에 비유함으로써 그런 감각이 항구적 소유의 영역이 아니라 일회적 촉발의 사건임을 말한다. 시인 자신이 손에 넣었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 스스로 찾아오는 것들을 맞이하여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의 시작(詩作)은 ‘섭농(攝農)’이 된다.
어떤 날은 밤나무가 툭 던져 주고
어떤 날은 까마귀가 까치가 직박구리가
시(詩)를 물어 온다
어느 날은 깨진 항아리가 울음 울어 시 속에 수련이 피고
어느 날은 늙으신 어머니가
옜다 받아 적어라 케케묵은 골동 구럭을 푼다
알고 보면 나의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다
매사 어설뱅이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변들이 섭농(攝農)을 해 주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인연 보시
어느 생 어느 인연들이
이승의 저물녘 푸새 고랑에 찾아와
김을 매 주고 가는 것이다
삼라(森羅)에 빚이 많다
―「섭농(攝農)」 전문
이선식 시인이 생각하는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다. 이선식 시인은 “나의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고, “밤나무”가, “까마귀가 까치가 직박구리가”, “깨진 항아리”와 “늙으신 어머니”가 던져 주고 물어다 주고 울어 주고 풀어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시작(詩作)이 ‘섭농’이라고 고백한다. 언어로 구현되지 못한 시어와 문장을 찾아 미지의 숲으로 들어간 시인의 시를 향한 경외감과 열망이 엄숙하게까지 느껴진다.
■ 차례
시인의 말
1부
어린 목동
자기 앞의 생
하루
신화(神話)
나무와 광부(鑛夫)
흰죽 같은 말 한술
백 년 만에 내리는 눈
까마귀공회당
수탉
오후
비를 맞는 문장들
가난
관중(貫衆)
봄은 어떻게 오는가
2부
사랑의 인사
파안대소
문장채집
길 잃은 바람
물길 내던 할머니
바람의 정석
생산적인 너무나 생산적인
월명리(月明里)
슬픔의 총량
귀를 씻다
꽃을 심는 이유
여우에게
물뱀이 강을 건너간 날
나들에게 보내는 안부
슬픔이 찰랑찰랑
3부
무죄(無罪)
빈 의자
너와 나의 우산
쪽동백나무에게 청혼하다
이사
숙취(熟醉)
그리운 쥐를 찾아
나무와 봄비
주문진
적멸(寂滅)
애인
물방울 신부(新婦)
별빛편지
라면을 끓이며
자동세차기
상류층 시인―서정춘
4부
휴일
내 마음의 초가
똥둣간에서
아우에게
목마른 영가(靈駕)를 위하여
무수한 입
난산(難産)
천진항
최초의 여행
마중
춘천
섭농(攝農)
돌아오지 않는 여행(旅行)
까마귀
눈길
해설 | 이승우(소설가)
시, 신이 쓴 사랑의 편지
―이선식의 시집 『귀를 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