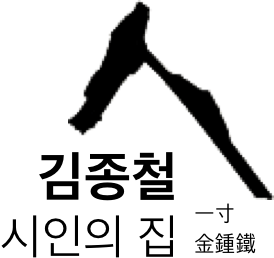시인의 말
나는 이제부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바람을 쐬러 나와서 이제 비로소 당신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별, 병, 눈물, 파탄, 환멸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언제나 다시 찾을 수 있는 손실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소실은 이제 나의 개인적인 적이 되었다. 이 모든 개인적인 적들이 나를 질문할 수 있게 하였고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 가는 힘이 되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을 초극하는 문제였고, ‘자기’를 뛰어넘는 사소한 문제였다.
나는 늘 이러한 문제와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
나는 8년 동안 써 모았던 이 작은 시집이 나의 생애에서 영구히 남으리라는 기대는 갖지 않는다. ‘영구히’라는 말은 망발이다. 그러나 버림받고 저주에 가득 찬 이 죽은 언어의 껍질들을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 집착한다.
빛깔도 띠지 않고 여물지 못한 이 과일들을 따냄은, 보다 알찬 과일을 가꾸어 내기 위해 솎아 내는 방편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설익은 정신을 위해 축배를 든다.
내가 처음으로 자기에서 확고하게 자신을 갖지 못한 것도 이 시집을 엮는 날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이 시집이 완성된 뒤였기 때문이다.
*
나는 죽을 때까지 詩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1975년 5월
김종철
목차
自序
죽음의 遁走曲
베트남의 七行詩
닥터·밀러에게
죽은 산에 관한 散文
소품
病
흑석동에서
우리의 한강
네 개의 착란
서울의 遺書
서울의 不姙
서울遁走曲
金曜日 아침
野性
여름데상
딸에게 주는 가을
아내와 함께
이 겨울의 한잔을
만남에 대하여
떠남에 대하여
헛된 꿈
탁발
두 개의 소리
招請
裁縫
겨울 포에지
겨울 變身記
나의 癌
失語症
밤의 核
나의 感氣
시각의 나사 속에서
비
나의 잠
處女出航
바다 변주곡
打鐘
個人的인 問題
歸家
公衆電話
시 읽기
재봉
사시사철 눈오는 겨울의 은은한 베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에는
집집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을의 하늘과 이들이 쉬고 있다.
마른가지의 暖冬의 빨간 열매가 繡실로 뜨이는
눈 나린 이 겨울날
나무들은 神의 아내들이 짠 銀빛의 털옷을 입고
저마다 깊은 內部의 겨울바다로 한없이 잦아들고
아내가 뜨는 바늘귀의 고요의 假縫,
털실을 잣는 아내의 손은
天使에게 주문받은 아이들의 全生涯의 옷을 짜고 있다.
설레이는 神의 겨울,
그 길고 먼 복도를 지내나와
사시사철 눈오는 겨울의 은은한 베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
아내가 소요하는 懷孕의 고요 안에
아직 풀지 않은 올의 하늘을 안고
눈부신 薔薇의 알몸의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아직 우리가 눈뜨지 않고 지내며
어머니의 나라에서 누워 듣던 雨雷가
지금 새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다.
눈이 와서 나무들마저 儀式의 옷을 입고
祝福받는 날.
아이들이 지껄이는 未來의 낱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織造의 방에 누워
내 凍傷의 귀는 영원한 꿈의 裁斷,
이 겨울날 조요로운 아내의 裁縫일을 엿듣고 있다.
―〈한국일보〉 68년 1월 1일
서울의 유서
서울은 肺을 앓고 있다
도착증의 언어들은
곳곳에서 서울의 口腔을 물들이고
완성되지 못한 소시민의
벌판들이 시름시름 앓아 누웠다
눈물과 비탄의 금속성들은
더욱 두꺼워 가고
병든 시간의 잎들 위에
가난한 집들이 서고 허물어지고
오오 집집의 믿음의 우물물은
바짝바짝 메마르고
우리는 단순한 갈증과
몇 개의 죽음의 열쇠를 지니고 다녔다
날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양심의 밑둥을 찍어 넘기고
헐벗은 꿈의 알맹이와
약간의 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밤마다 죽음의 깊은 지하수를
매일매일 조금씩 길어 올렸다
절망의 삽과 곡괭이에 묻힌
우리들의 시대정신에서 흐르는 피
몇장의 지폐에 시달린 소시민의 운명들은
탄식의 밤을 너무나 많이 싣고 갔다
오오 벌거숭이 거리에
별들은 개들이 어슬렁거리고
새벽 두시에 달아난 개인의 밤과
십년간 돌아오지 않은 오딧세우스의 바다가
古書店의 활자 속에 비끌어매이고
스스로 주리고 목마른 자유를
우리들의 일생의 도둑들은 다투어 훔쳐 갔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죽음의 눈들은
집집의 늑골 위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콘크리트 뼈대의 거칠거칠한 통증들은
퇴폐한 市街의 전신을 들썩이고
오염의 찌꺼기에 뒤덮인
오딧세우스의 청동의 바다는
몸살로 쩔쩔 끓어 올랐다
그때마다 쓰라린 고통의 서까래는
제풀에 풀석풀석 내려앉고
우리가 앓는 性病 중의 하나가
송두리째 뽑혀 나갔다
어디서나 단순한 목마름과
죽음의 열쇠들은 쩔렁거리고
세균으로 폐를 앓는 서울은
매일 불편한 언어의 관절염으로 절뚝이며
우리들 소시민의 가슴에 들어 와 몸을 떨었다.
―〈現代詩學〉 70년 8월호
이 겨울의 한잔을
겨울의 마지막 기도와 단식,
나를 몰아낸 숲과 들판,
내 스스로 만들고 택한 이 겨울의 최후의 한잔을
그대는 마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
나의 마지막 것은
한 벌의 내의와 헐벗은 눈물뿐이다
맨처음 그대의 목소리는
바다에서 왔다
나는 그대의 한 목소리에
산도 높고 들도 놓고 조그만 집도 세워두었다
그대를 위해 마련한 일상의 꿈에
나는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갖도록 뜰도 쓸고
바다에 이르도록 冬菊도 가꾸었다
밤마다 그대의 꿈 위에 밀려오는 갯벌,
나의 붉은 어둠으로 들어와 기도하던 사나이들은
내가 기르는 산과 들과 허무의 나무마저 뿌리째 뽑아들고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몰아낸 숲과 들판,
내 스스로 만들고 택한 이 겨울의 최후의 한잔을
그대는 마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
―〈心象〉 74년 1월호
우리의 한강
내가 알고 있는 한강은 서울의 저녁이다.
빈궁의 이삭 까마귀떼의 이삭
저녁 술집에서 되찾는 언어의 이삭
끝없는 참음과 견딤의 이삭
이삭 이삭 이삭 이삭의 눈물껍질
완행열차 차창에 달겨붙어 있는 교각의 엇물린 꿈만이
매일매일 한강을 열세번이나 건너다니고
물을 떠난 한강은
아아, 어디에서나 젖는다
서울의 상반신을 묶은 越冬의 겨울짚과 八道의 사투리가 뒤섞여 떠다니는
겨울의 빈 술잔 부딪는 소리만 한강 밖에서 들리고
더러운 눈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한강은 어디에서나 젖는다
―〈한국일보〉 74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