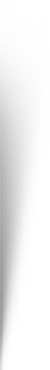평범한 일상이 지켜 낸 삶의 거룩
문성해의 『내가 모르는 한 사람』
‘보편적 삶’을 노래하는 시인 문성해의 다섯 번째 시집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이 ‘시인수첩 시인선’의 서른여덟 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네 번째 시집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에서 ‘밥’을 통해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문성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고되고 궁핍한 평범한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깊은 시선을 보여 준다. 다만 지난 시집의 ‘일상’에서 삶의 불안함과 불분명함이 엿보였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지나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거나/사랑할 수 없는 사람/시인”(「방랑자의 시」)으로서, 삶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지나간 시간과 현재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순간들에 대한 환대를, 해설을 맡은 이병국 시인은 “견고함이 주는 위안”이라고 말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삶을 관통하는 견고함
직전의 시집에서 고독이라는 절박함으로 삶을 기록하고 표현해야 하는 시인의 삶을 표현했다면, 이번 시집 『내가 모르는 한 사람』에서 시인은 지난날에 대한 사유를 통해 현재를 재구성한다. 이병국 시인은 해설에서 “삶의 지난 한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회한이란 현재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지난 시절의 곤궁을 통해 현재를 긍정하고자 하는 마음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삶에 대한 견고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문성해 시인이 사유하는 삶이란 극적이거나 화려한 삶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어찌 보면 통속적인 삶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인의 시는 생활에의 몰두를 전유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고 나서도 “두 시간쯤 지나자/숨도 혈색도 돌아오더니/밥도 떡도 먹고/메시지 확인도”(「두 시간」) 한다. “밥을 푸던 손으로/변기를 닦”(「변기 닦는 여자」)고, 서먹한 지인과 만나 “돼지껍데기에 붙은 젖꼭지가/불판 위에서/빵빵하게 부푸는 것만 보다 돌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통속적인 삶을 향한 몰두는, 간과하거나 부정되기도 하는 일상을 시적 재현의 차원으로 이끌어 절대적 환대로 포용하는 일이기도 하다.
빠르게 흘러가는 속도의 세계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둘러싼 존재들을 실감하고 그들의 삶을 잠시 살아 내는 것이야말로 문성해 시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농아 아저씨 한 분이 갖다준 참두릅
베란다에 둔 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신문지에서 펴 보니
가시가 잔뜩 세어져 있다
(……)
몸에서 목소리 대신 가시가 나오는
그 두릅나무 선생은 때가 되면
울퉁불퉁 몸엣것을 툭툭 불거지게 내놓으며
달달한 칭찬 대신
날카로운 가시들을 마구 방출할 것이다
맘에 안 들면 아예 벌판 위로 벌렁 내다꽂을 것이다
―「두릅」 부분
보팔로 가는 기차 안
맞은편 여인이
딸랑거리는 방울을 단 두 발을
내 쪽으로 뻗어 왔다
망아지처럼
두툼한 발바닥이다
쉼 없이 꼼지락거리는 몸통과 달리
쩍쩍 갈라진 그것은 몇 시간째 시체놀음이다
(……)
갈라질 발가락도 없이
백 개의 쇠바퀴를 가진 기차가 달리고
나는 발들이 누웠던 움푹한 자리로
손을 뻗어 본다
뒤늦은 악수인 양
―「발」 부분
신체적 제약으로 화자에게 시 창작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없었던 “농아 아저씨”가 보내 준 두릅, 기차 안에서 마주친 어떤 여자의 “쩍쩍 갈라진” 발에 대한 시적 사유는 그저 낭만적으로 소비될 관념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자가 직접 겪고 눈으로 본 일일 뿐만 아니라, “발들이 누웠던 움푹한 자리로” “뒤늦은 악수”를 건네거나, “스물여덟에 죽은 맹인 친구”를 떠올리며 “아무도 옆을 맞물려 주는 이 없이” “옆구리가 두둑해져 감”(「베드로」)을 비로소 씀으로써 과거의 시간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 주는 견고한 바탕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끈질기게 이어지는 삶의 거룩함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의 화자들은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며 현재를 사유한다. 이병국 시인은 “지나간 시절과 현재가 맞물리며 만들어 낸 순간을 수용하여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삶의 본류”라고 말한다.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을 지켜 냄으로써 삶을 유지하고 이행하는 일은 거룩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시 「나의 거룩」은 이 ‘거룩한 삶’에 대한 탁월한 사유다.
이 다섯 평의 방 안에서 콧바람을 일으키며
갈비뼈를 긁어 대며 자는 어린 것들을 보니
생활이 내게로 와서 벽을 이루고
지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조금은 대견해 보인다
태풍 때면 유리창을 다 쏟아 낼 듯 흔들리는 어수룩한 허공에
창문을 내고 변기를 들이고
방속으로 쐐애 쐐애 흘려 넣을 형광등 빛이 있다는 것과
아침이면 학교로 도서관으로 사마귀 새끼들처럼 대가리를 쳐들며 흩어졌다가
저녁이면 시든 배추처럼 되돌아오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도 거룩하다
내 몸이 자꾸만 왜소해지는 대신
어린 몸이 둥싯둥싯 부푸는 것과
바닥날 듯 바닥날 듯
되살아나는 통장잔고도 신기하다
몇 달씩이나 남의 책을 뻔뻔스레 빌릴 수 있는 시립도서관과
두 마리에 칠천원 하는 세네갈 갈치를 구입할 수 있는
오렌지마트가 가까이 있다는 것과
아침마다 잠을 깨우는 세탁집 여자의 목소리가
이제는 유행가로 들리는 것도 신기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닦달하던 생활이
옆구리에 낀 거룩을 도시락처럼 내미는 오늘
소독 안 하냐고 벌컥 뛰쳐 들어오는 여자의 목소리조차
참으로 거룩하다
―「나의 거룩」 전문
물론 시집 속 화자들은 “쌀 한 톨을 두고 대치하”거나(「바구미를 죽이는 밤」) “두 시간 강의를 위해 왕복 여섯 시간을”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내는 등, 전선으로서의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 간다. 그러나 “가도 가도 따뜻한 방과는 멀어졌”(「서설홍청(鼠齧紅菁)」)던 최북의 사연처럼 초라하고 궁핍한 삶이라 하더라도, 시인은 삶의 지속을 긍정한다.
(……)
난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으므로
햇볕과 비와 바람을 공짜로 쐴 것이다
무전취식을 할 것이다
경찰서에도 수시로 들러
난 남은 생을 바짝바짝 담배꽁초처럼 태워야지
목숨을 놓고 삶과 거래를 해야지
그러다가 자꾸 명이 길어지면
본전 생각 난 친구들도 다 끊기고
이곳에 왔을 때처럼 난 발가벗겨지겠지
돈 없이 명을 잇는 게 거지라면 난 거지가 되겠지
죽음이 마침내 날 건드리며 공짜로 치워 줄 때까지
난 진정한 지구인으로만 살 것이다
귀신이 따로 없을 것이다
―「지구인―고 사노 요코에게」 부분
문성해 시인의 견고한 사유가 견지하는 현재성은 우리로 하여금 영속된 시간이 선사하는 순간을 긍정하게 한다. 그 견고함은 우리에게 삶의 무게로 마냥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위안을 준다.
■ 차례
시인의 말
1부
뒤태
나의 거룩
은빛 자전거에 대한 명상
서설홍청(鼠齧紅菁)
그때의 춤은
두릅
버섯
밖이라는 것
두 시간
바구미를 죽이는 밤
두루마기에 보자기 쓴 여인을 보다
생몰미상(生歿未詳)
방과 후 강사
달리는 울음
추일서정(秋日抒情)
2부
학원들
방랑자의 시
말, 혹은 물품
화가
세녹스
사랑의 법칙
늙은 기차
난초도둑
관람의 자세
지구인―고 사노 요코에게
변기 닦는 여자
베드로
벌치는 여자
과일 파는 사람을 위한 랩소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발
Y의 이불
3부
늙은 제자
쌀 점(占)을 보러 가다
밖이 키운 아이
계곡
오일장 해부학
꽃중년
첫 기차에는 창(窓)이 많다
인면어
처서
연을 든 사람
혼자 먹는 밥
울음 나무 아래를 지나다
나무로 만든 다리
연(蓮)의 시
종달리
베란다에는 빨래가 마르고
전화
오늘의 무전취식
해설 | 이병국(시인․문학평론가)
견고함이 주는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