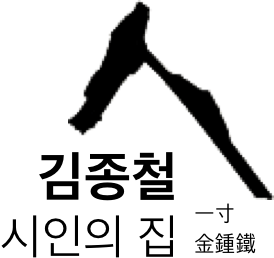<김종철문학상>은
‘못의 사제’로 불리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 시대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한 고故 김종철 시인의 시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시문학을 응원하기 위해 (주)문학수첩과 김종철시인기념사업회에서 제정한 시문학상입니다.
 수상자 및 수상작
수상자 및 수상작
이선영, 『60조각의 비가』 (민음사, 2019)
이선영 시인
1990년 『현대시학』 등단.
시집 『오, 가엾은 비눗갑들』, 『글자 속에 나를 구겨넣는 다』, 『평범에 바치다』, 『일찍 늙으매 꽃꿈』, 『포도알이 남기는 미래』, 『하우부리 쇠똥 구리』 『60조각의 비가』가 있음.
현재 이 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사장되고 폐기되는 오답에 보내는 연민과 동정
그리고 참신한 시적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살아 숨 쉬는 시어들
〈김종철문학상〉의 대상은 작품의 완성도에서 뛰어난 기량을 지녀야 함은 물론, 김종철 시의 성격과 지향, 시정신과의 연계성을 살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이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회 〈김종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선영 시인의 『60조각의 비가』에는 고착된 관념과 선입견을 깨며 사물의 가치와 존재 의의를 단답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넘어서는 깊은 숙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만을 인정할 때 여타의 답은 오답이 될 것입니다. 사장되고 폐기 되는 오답에 보내는 연민과 동정은 비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가치와 존재 의의 가 단답일 수만 없고 단답 이외의 오답 속에서 더 진실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은 비가 를 송가로 전환시키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허영자(시인)
이선영 시인이 펼쳐 보인 시세계를 살펴보면, 삶의 사소한 순간들이 시인의 사색과 언어를 통해 깊이와 무게를 얻고 있다. 어찌 보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일상의 평범한 사물에서 새 로운 의미와 의의를 읽어 내고 이에 광휘를 부여하는 특별한 시적 능력을 부족함 없이 펼쳐 보이고 있거니와, 이는 일찍이 워즈워스의 시에서 코울리지가 찾았던 “시적 상상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로 이선영 시인의 시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참신한 시적 이미지들과 자연스럽게 살아 숨 쉬는 시어이며, 수많은 작품이 생각의 깊이와 시선의 섬 세함 및 날카로움을 엿보게 한다. ―장경렬(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선영은 비가의 플랫폼을 개량하여 슬픔에서 연민 사이의 문장을 정교하게 잘라서 깁거나 붙이는 아플리케의 영토에 도달했다. 대상의 상실이나 부재의 노래이기에, 상실과 부재는 시 집 『60조각의 비가』 속에서 같은 육체의 형식이 될 때까지 되풀이된다. 이 육체성 덕분에 비 가이기 전에 이미 비가이고픈 세계를 끌어안는 다정함이라는 능동성이 잘 보인다. 비가일 수 밖에 없는 세간의 생활과 마음까지 모두 합쳐서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착 하는지에 대한 순간들이 시집 전체에 고스란히 침전되었다. 상실과 부재를 육체의 기억이라고 도 호명하지만, 시인은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여 자신의 기억으로 재생산해내는 윤리학까지의 노정을 실천한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송재학(시인)
이선영의 『60조각의 비가』는 감상적인 슬픔을 걷어낸 비가 모음집이다. 비가의 목록이 전래 의 사랑과 슬픔의 영역을 넘어 이웃과 타자에 대한 연민과 연대에 이르기까지 더 확대되어 있 다. 이처럼 ‘60조각의 비가’가 감상의 표층을 지나 타자의 고통에 대한 연대는 물론 주위의 인물과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에 도달한 건, 시인이 이제까지 일관되게 보여 준 시와 삶을 분리하지 않는 시정신의 소산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집은 각각의 시편들의 완 성도가 높다. 시인의 지론인 몸과 살의 체험과 내밀한 자의식의 언어를 바탕으로 한 시 쓰기 의 도정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시인이 지향하는 세계가 어느 정점에 서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송찬호(시인)
등단 30년 만의 첫 수상
이선영 시인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및 같은 학교 대학원 졸업하였 습니다. 1990년 『현대시학』에 「한여름 오후를 장의차가 지나간다」 외 8편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오, 가엾은 비눗갑들』 『글자 속에 나를 구겨넣는다』 『평범에 바치다』 『일찍 늙으매 꽃꿈』 『포도알이 남기는 미래』 『하우부리 쇠똥구리』 등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적 세계를 선보 이는 시집들을 출간하였습니다. 시집을 출간하고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문단의 긍정적 평가와 우호적 반응을 있긴 하였으나 3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상이 없어, 시인의 주변에서는 문운 이 없다며 시인보다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상 사실을 통보하는 통화에서도 이선영 시인은 자신의 수상을 실감하지 못한 듯 “이게 무 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라는 말을 연발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이선영 시인의 문학적 가치와 가능성이 재조명받게 된 소중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시는 무관無冠이라고, 상과는 무관하다고 애써 저를 다독이며 이 무관과 무명無名의 시 쓰기가 언제인가부터는 제게 되레 큰 자유가 되고 자족이 되어 왔던 이즈음인데, 이제야 “기다림의 슬픔까지”(정호승) 다 지나 온 듯한 이 마당에 “늦게 온 소포”(고두현)를 받아 든 놀라움과 어리둥절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머릿속에서 수없이 재생해 봤던 필름의 광휘가 실제로 눈앞에서 재생되자 필름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열광과 환호와 설렘이라 는 수상자의 신화는(아차, 제가 아카데미상 필름을 돌렸었나요?ᄏᄏ) 제게는 없었습니다. (……)
전학 와서 학기말의 어느 날, 반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그 후로 내내 잊히지 않았습니 다. “너 처음 전학 왔을 때 나는 너 벙어린 줄 알았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저는 책상에 혼자 앉아 제 〈시 모음 노트〉에 시만 적었습니다. 윤동주 시를 색색의 컬러 펜으로 필사했고 어이없는 제 자작시를 적어 보기도 했지요. 그래도 그때는 시가 뭔지도 잘 몰랐 고,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문학 동아리인 ‘이화문학회’ 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시를 읽고 쓰면서 처음으로, 평생 시를 쓰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 던 듯합니다. 그 시절에도 삶의 많은 것들이 저에겐 그저 상처였고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어 서, 오직 시를 쓸 때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제게 생기 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대학 4년 지나 졸업할 무렵엔 다른 할 줄 아는 것도,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신 있는 것도 없었고요. 공부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고…… 그냥 지상에 발붙일 제 시의 단칸방 하나가 절실했습니다. (……)
이제는 저도 좀 포복하는 시만 말고 비상하고 날아다니는 시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제가 지향하는 궁극의 시란 사실 그런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육체적 삶의 총합인 시를 통해서 마침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비상……. 그러려면 그에 걸 맞은 제 삶의 비약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 궁극의 시는 끝내 불가지·불 가능의 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제넘은 바람은 다 버리고, ‘이선영의 시는 최소한 거짓되거나 허황되지는 않다, 소박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정도 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간은 줄곧 나약했습니다. 강해지는 것―이것이 제 시의 염원입니 다. ―수상자 인터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