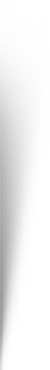우리말 지킴이 권오운이 떴다우리말 지킴이를 자임하며, 그동안 『알 만한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1234가지』 『우리말 지르잡기』 등의 책을 통해, 유명작가들의 문학작품은 물론 교과서, 신문, 방송 등에서 잘못 쓰인 우리말의 용례를 조목조목 짚어냈던 권오운의 신간 『작가들이 결딴낸 우리말』((주)문학수첩)이 출간되었다. 강석경, 구효서, 신경숙, 공지영, 은희경 등 우리 문단의 중견 소설가부터 지난해에 등장한 김애란은 물론 정이현, 천운영, 한강, 이만교, 박성원, 한창훈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50여 명 작가들의 글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이 책은 이문열, 황석영, 장정일의 삼국지에서 각각 빚어진 잘못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낸다. 권오운의 매서움은 꼭지 제목에서부터 느껴진다. “구둣발 들고 토꼈다” 성석제는 이렇게 말했다 / ‘나시티’ 입고 ‘색경’ 앞에서 ‘콩깍지 까는’ 김현영 /‘고상떨다’가 졸문·비문 만드는 김별아 /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는 ‘화냥녀’가 아니다 / ‘모델하우스’에 ‘퍼질고’ 앉은 서하진의 『라벤더 향기』 / ‘손부채 만들어 이고’ 함정임의 『버스, 지나가다』 /‘열라 쪽팔리고 졸라 짱나는’ 정이현의 〈소녀시대〉 / 윤대녕에게 ‘자문을 구하’노니, ‘우체통 아가미’란? / ‘옥수수나무’에서 ‘밤쓰르라미’ 우는 구효서의 『몌별』 / ‘지나치게 아방가르드한’ 정미경의 〈피투성이 연인〉 / 전혜성의 〈집나들이〉에는 ‘무등’ 탄 ‘활꽃게’가 있다 / ‘멀뚱’보며 ‘열변하는’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 / 장수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말은 주리틀린 이문열 『삼국지』아름다운 우리글을 갈고 닦자고 퉁바리를 놓은 책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한 그의 두 번째 저서가 출간되었을 때, 작가는 “영어발음을 잘하게 하려고 애 혓바닥 수술까지 시키는 시대에 우리말, 우리글을 갈고 닦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제 말 제 글이나 제대로 하고 나서 영어든 뭐든 하라고 퉁바리를 놓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저서를 출간하면서 “오랫동안 벼르던 일이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움과 두려움 또한 그만 못지않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나라도 더 건져서 제대로 꼬집고 지르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천박(?)한 식견으로 종작없이 덤벙대기만 했다는 질책이 두려움이고, 제대로 익힌 학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름 석자 자르르한 문필가도 못 되는 처지에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따따부따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데뷔하고 〈학원〉의 편집기자로 시작해 〈KBS 여성백과〉의 편집장을 마칠 때까지 30년간 잡지 취재·편집을 해온 그는 재직 중에도 남의 원고를 만지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문헌을 뒤져 바른 표현을 찾아냈다. 그런 직업의식이 발동해 우리 주위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표현을 허투루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은퇴 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시창작 강의를 하면서도 바른 우리말, 우리글을 쓰고 알리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모국어의 연금술사인 작가들은 글을 쓸 때 좀 더 자주 국어사전을 뒤적여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상식에 벗어나고 이치에도 안 맞는 문장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작가들의 억지와 횡포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곧춘 권오운이 매운 죽비를 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말 분류 소사전’이다. 잘못 쓰인 낱말의 예문이 실린 쪽 밑에 그 말과 관련되게 자리 앉힌 소사전은 오랫동안 저자가 벌여온 『우리말 분류 사전』의 ‘맛보기’로서 읽는 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들의 억지와 횡포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곧춘 우리말 책* 기분이 상하면서 속세말로 열불이 나서 견딜 재간이 없었다. – 신경숙의 「달의 물」에서 우선 ‘속세말’이란 말은 없다.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은 ‘속어(俗語)’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시대의 유행어’라는 뜻인 ‘시쳇말’이 제격이다. 다음 ‘열불’이란 ‘매우 흥분하거나 화가 난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속세말’로서가 아니라도 바른말이다. * 몸집이 비대한 이 국장은 모 심다 나온 사람마냥 양복바지마저 둥개둥개 걷어붙인 모습이었다. – 권지예의 「투우」에서여기서는 ‘둥개둥개’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둥개둥개’는 다 아는 것처럼 ‘아이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이다. 그러면 울던 아기도 울음을 그치고 까르륵까르륵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복바지를 걷어붙인’ 모양새를 두고 ‘둥개둥개’라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다. 소매나 바짓가랑이가 ‘걷어붙여’진 모양은 ‘둘둘’이다. ‘큰 물건이 여러 겹으로 둥글게 말리는 모양’이 ‘둘둘’이니까.* 나는 두 구둣발을 들고 힘차게 토꼈다.- 성석제의 「성탄목」에서‘구둣발을 들고 토꼈다’가 이상하다. ‘구두를 신은 발’이 ‘구둣발’인데 그것을 (그것도 두 짝 다) 들고 어떻게 뛴단 말인가? 신경숙이 ‘발자국을 들고 걷는다’고 했다가 내 지청구를 들은 바 있거니와 이제 성석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여자는 발자국을 들고 걷고, 남자는 구둣발을 들고 뛴’단 말인가? 물론 ‘발자국을 들고’와 ‘구둣발을 들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이나 둘 다 용서는 되지 않는다. 아무리 ‘줄행랑치다(놓다)’를 과장되게 표현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두 발로’ 뛰어야지 ‘두 발을 들고’는 뛸 수가 없다. 안 그런가?* 남자 밑에 깔려 색을 쓰면서도 카르멘인가 뭔가 그따위 고상을 떨어야 하는 여자……. – 김별아의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에서‘품위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하고 훌륭하다’가 ‘고상(高尙)하다’의 풀이이다. ‘고상한 인격’, ‘언행이 고상하다’처럼 쓰인다. 따라서 ‘고상 떤다’고는 할 수 없다. ‘고상’은 ‘떨’ 수도, ‘부릴’ 수도, ‘거릴’ 수도 없는 말이다.* 스물도 안 된 처녀가 남자와, 그것도 평판이 안 좋은 남자와 도망을 치다니, 그녀는 배신자며 도둑이며 화냥녀였다. –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에서‘화냥녀’는 ‘화냥년’의 잘못이다. ‘화냥년’은 ‘화냥’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며, ‘화냥’은 ‘서방질하는 여자’이다.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는 짓’이 ‘서방질’이니까 예문의 ‘그녀’는 비록 평판이 안 좋은 사내와 도망은 쳤지만 엄밀하게 따져 최소한 ‘화냥년’은 아니다. ‘그녀’는 ‘처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내와 ‘난질’에 든 것일 뿐이다. ‘여자가 정을 통한 남자와 도망가는 짓’이 ‘난질’이다. * 담배 대신, 달달한 자판기 커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목구멍에 털어 넣었다. – 정이현의 「홈드라마」에서여기 나오는 ‘달달하다’는 아예 없는 말이고, ‘다달하다’와 ‘달다하다’는 사전에 보이는 말이긴 하나 이마저 ‘달곰하다’와 ‘달콤하다’의 방언이다. ‘달다’는 표현 역시 수도 없이 많거늘 하필이면 엉터리 말을 갖다 들이댈까.* 종아리 정가운데 박혀 있는 자신의 체모 한 올을 발견했다. 아마도 팬티스타킹을 신던 중 속옷에서 떨어져 그 곳에 붙은 모양이었다. 체모는 다른 털과는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윤기와 웨이브를 가지고 있었다. – 김애란의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에서‘체모’가 잘못 쓴 말이다. 체모란 무엇인가? ‘몸에 난 털’ 즉 ‘몸털’이 체모(體毛)다. 그런데 ‘체모는 다른 털과 구별’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다른 털’이라면 사람의 것 말고 짐승털을 말함인가? ‘팬티스타킹을 신던 중 속옷에서 떨어진 모양’이라니까 사람 털은 분명 사람털이다. 그렇다면 여기 쓰인 ‘체모’는 잘못 쓰인 것이 확실하다. 더군다나 ‘윤기와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털이라고 자세히 묘사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체모’가 아니라(체모이기는 하나) ‘음모(陰毛)’ 즉 ‘거웃’이다. ‘치부(恥部)에 난 털’이라고 하여 ‘치모(恥毛)’라고도 한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때 우리말과 우리글은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잘못된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기 위해 읽었을 많은 문학작품들과 이러한 것들에 사용된 우리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들여다보았을 각종 사전 등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들인 저자의 시간과 열정, 우리말에 대한 애정을 페이지마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5
‘유실과’ 심고 마늘 ‘빻는’신경숙의 ‘뒷배경’11
‘밥때’도 잊고 <브라스 밴드를 기다리>는 김인숙 20
권지예의는 ‘북청색’꿈을 꾼다 26
“구둣발 들고 토꼈다” 성석제는 이렇게 말했다 31
‘길어깨’에 나앉은 이혜경의 『길 위의 집』 37
‘잔푼도’에 ‘예민해하는’배수아의 부주의 43
백민석의 <목화밭>에는 엽기 ‘앞통수’가 있다 49
‘생뚱 같은 생각’의 이승우, <아주 오래 살 것이다> 54
걸고 받는 이가 뒤바뀌는 은희경의 전화화법 58
‘나시티’입고 ‘색경’앞에서 ‘콩깍지 까는’김현영 65
‘고상떨다’가 졸문.비문 만드는 김별아 72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는 ‘화냥녀’가 아니다 78
‘막장갑’끼고 ‘벼루 가는’이명랑의 <이복형제들> 83
『검은 꽃』피워 들고 김영하 『오빠가 돌아왔다』 88
‘엽소를 모는 여자’전경린의 ‘손수건 놀이’ 96
‘가수면’에서 허덕이는 한 강의 『여수의 사랑』 103
하성란이 ‘놀래킨’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 109
‘호야불’들고 한창훈,‘세상의 끝’으로 가다 116
‘모델하우스’에 ‘퍼질고’않은 서하진의 『라벤더 향기』 124
‘폭폭증’으로 ‘놀놀한’공선옥의 <생의 알리바이> 130
김형경의 『성에』 낀 ‘놋쇠화로’에 ‘허풍’분다 136
이만교의 사투리, <번지점프 하러 가다> 142
천운영의 『바늘』은 ‘관자’도 뜯고 ‘화분’도 한다 149
송은일의 『도둑의 누이』는 ‘홀몸’인가, ’홑몸‘인가? 154
‘손부채 만들어 이고’ 함정임의 『버스,지나가다』 159
민경현의 『붉은 소묘』에는 ‘중늙은’스님이 있다 166
강석경의 『미불(米佛)』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172
‘열라 쪽팔리고 졸라 짱나는’정이현의 <소녀시대> 176
<양철 지붕 위에……> ‘즈즐펀한’김한수의 사투리 180
‘여태도’코끼리 찾아 ‘뒤우뚱’거리는 조경란 186
윤대녕에게 ‘자문을 구하’노니, ‘우체통 아가미’란? 190
임영태의 『무서운 밤』은 ‘맥살없이 애운하다’ 196
강영숙은 『날마다 축제』하러 ‘페달질’로 간다 200
정길연의 『쇠꽃』은 ‘고약을 떨며’피었다 207
‘창천한 하늘’,‘봄닭 같은 날씨’에 박성원이 왔다 212
정정희의 ‘수부(受付)’에는 ‘졸리운 눈’이 있다 217
김이정의 『물속의 사막』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다? 223
‘옥수수나무’에서 ‘밤쓰르라미’우는 구효서의 『몌별』 227
‘지나치게 아방가르드한’정미경의 <피투성이 연인> 231
전혜성의 <집나들이>에는 ‘무등’ 탄 ‘활꽃게’가 있다 238
‘햇봄’에 ‘햇열무김치’담그는 우애령의 『당진 김씨』244
<달밤에 몰래 만>난 원재길의 쓰르라미 252
오수연의 『부엌』에서는 ‘달달한 내음’이 난다 256
‘멀뚱’보며 ‘열변하는’김애란의 『달려라,아비』 261
‘단호박’에 누가 이름 좀 붙여 주시죠! 267
‘햇참외’가 아니라 ‘해참외’이다 274
회초리로 ‘허벅지’를 때릴 수는 없다 277
‘휑한 복도’와 ‘휑뎅그렁한 휴게소’281
‘외로움을 즐기는 것’이 ‘홀로움’이라고? 283
‘무색옷’은 ‘색깔 있는 옷’이다 286
‘목덜미’에는 앞뒤가 있을 수 없다 289
상식에 벗어나고 이치에도 안 맞는 문장들 (1) 291
상식에 벗어나고 이치에도 안 맞는 문장들 (2) 294
상식에 벗어나고 이치에도 안 맞는 문장들 (3) 300
‘새된’눈으로 ‘굴비 꿰고’또 ‘보릿물’마신다 3085
빚쟁이와 ‘콩장판’과 ‘묘지를 고르는 노인들’312
발 ‘굴리’며 ‘산구완’하고,‘피로도 회복하고’320
맘마 먹고 맴맴, 찌찌 먹고 짝짜꿍! 325
인절미는 찰떡이지만 ‘찰떡=인절미’는 아니다 328
‘불투명유리’에서 ‘간유리’와 ‘젖유리’까지 331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바뀌어야 한다 334
‘벼략치기’로 물고기 잡고, ‘가루택이’로 꿩 잡고 336
‘오얏’과 ‘자두’그리고 ‘꽤’,어떻게 다른가? 341
|『삼국지』다시 읽기①| 장수는 ‘죽임을 당하고’우리말은 주리틀린 이문열 『삼국지』 334
|『삼국지』다시 읽기②| 장수도 다치고 우리말도 다친 황석영 『삼국지』 372
|『삼국지』다시 읽기③| 작가 실수 못지않은 편집 오류, 장정일 『삼국지』 387
■ 찾아보기…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