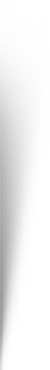죽었다 깨더라도 ‘민들레 홀씨’는 없다!
‘성긴 눈’은 있어도 ‘성긴 눈발’은 없다!
우리 정서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어(詩語)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중 표현이 문맥에 맞지 않거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들이 적지 않다. 우리말의 순기능을 이끌어야 할 시인들이 도리어 우리말을 더럽히고 오염된 낱말을 퍼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말 장인’ 권오운이 시 속에서 잘못 쓰인 낱말을 바로잡고 우리말의 참된 묘미를 되살려준다.
일그러진 우리말을 꼬집어 내어 수선하다!
《작가들이 결딴낸 우리말》에서 우리 문학 작품에 사용된 잘못된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 우리말의 옳고 그름을 알려줬던 우리말 지킴이 권오운이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시’로 우리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에 출간된 권오운의 신간 《시인들이 결딴낸 우리말》은 작가가 5년여에 걸쳐, 시인들의 우리말 실력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더듬어 본 결과물이다.
저자가 작가들의 우리말 실력을 세상에 밝혀온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말글에 대한 제대로 된 모양새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감동을 받는 언어의 진수라는 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저자는 우리 말글을 주물럭거리는 되잖은 솜씨는 시인들도 작가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로라하는 시인일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다고 통탄한다. 어찌 보면 작가든 시인이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 우리 말글쯤 더욱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산달 앞둔 임산부’는 한마디로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 안 들 소리다. ‘임산부’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저지른 실수다. ‘임산부(姙産婦)’는 ‘임부(姙婦)’ 즉 ‘임신부(姙娠婦)’와 ‘산부(産婦)’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산달을 앞둔’ 사람은 ‘임부’ 또는 ‘임신부’만이지, 임신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임산부’는 될 수 없다.
‘성긴 눈발’은 한마디로, 정색을 하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농지거리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다. ‘성긴’은 ‘성기다’, 즉 ‘성글다’와 같은 말로 ‘물건의 사이가 뜨다’이고, ‘눈발’은 ‘눈이 힘차게 내려 줄이 죽죽 져 보이는 상태’인 까닭이다. ‘죽죽 내리치는 눈 줄기’가 ‘성기게’ 내린다는 꼴이니 이거야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랴.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몇몇 발문만 살펴봐도 흔히 써왔던 틀린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책 속에 실린 150여 명의 시인들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이런 많은 시인이 여전히 우리 말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사라지는 우리말을 끄집어내어 되새기다!
이 책에 실린 글 서른네 편 가운데 열아홉 편은 《시인수첩》에 연재되었던 것을 출간을 위해 손본 것이고, 나머지는 온전히 새로 쓴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위해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글 말고 수백 권의 시집을 더 읽어냈다.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예문은 그 결과물이다.
권정생의 <강아지 똥>에서 시작된 ‘민들레 홀씨’는 나희덕의 <학교다녀오겠습니다아>, 송찬호의 <손거울>, 이문재의 <민들레 압정>, 고진하의 <유목>, 정호승의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등등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꽃이 피었으면 씨앗이지 어디서 툭 튀어나온 홀씨 타령인지 저자는 이 말도 안 되는 ‘민들레 홀씨’ 망녕그물에 종지부를 찍었다.
틀리게 사용된 것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을 단어들이 저자의 손에서는 제대로 기합을 받는다. ‘벚꽃’이 피었다고 ‘벚나무’가 하루아침에 ‘벚꽃나무’가 되는 게 아니며, ‘산달을 앞둔’ 사람은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다. 잘난 척하며 읊어대던 ‘지구의 반대편’은 사실 있을 수 없으며, ‘물건의 사이가 뜨다’를 표현하는 ‘성긴’과 ‘눈이 힘차게 내려 줄이 죽죽 져 보이는 상태’인 ‘눈발’이 어떻게 같이 올 수 있단 말인가. ‘성긴 눈발’이야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랴.
사라지는 우리 말글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저자는 잘못 사용되는 우리 말글 대신 사용해야 하는 아름다운 우리 말글을 수록해놓았다. 어디에 이런 아름다운 우리 말글이 숨어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무 이름,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올가미와 덫의 가지, 소나무의 한살이, 모내기부터 추수 타작에까지 이르는 우리말, 전통주 이름, 다양한 술 이름, 주방용품 이름, 나물 이름, 색 다른 김치 이름, 베틀의 구조와 기능, 잠 이름, 전통놀이, 생활도구 이름, 밥 이름, 그릇 이름 외에도 소, 버선, 전, 떡, 색깔, 논밭, 농기구, 집, 냄새, 고기잡이 등과 관련된 벌써 생경해진 안타까운 우리 말글을 수록해놓았다. 더 잊히기 전에 널리 알려야 할 일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언어란 관심을 기울이고 아끼는 만큼 아름다워지고 발전한다. 말이 생각의 그릇을 키우고 그 생각이 나라의 수준을 올리는 만큼 국민이 국어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본문 중에서
말이 생각의 그릇을 키우고 그 생각이 나라의 수준을 올리는 만큼 국민이 국어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소리다. 되잖게 휘갈겨대다가는 우리의 소중한 한국어는 ‘가정언어’로도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말이 통해야 말이지!_12~13쪽, <1장 • 산과 들에서 잘못 피어난 우리말>에서
‘이불을 꿰매고’ 또 ‘단추를 꿰매는’ 것이 옳은 표현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선 ‘꿰매다’의 뜻부터 알아보자. ‘옷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가 ‘꿰매다’이다. 그렇다면 (4)의 경우는 어떤가? ‘홑청의 귀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아내는 지금 이불의 어디를 꿰매는 것이 아니라, 벗겨서 빨아 놓은 홑청을 ‘시치고’ 있는 것이다. ‘바느질할 때, 여러 겹을 맞대어 듬성듬성 호다’가 ‘시치다’이다._132쪽, <2장 • 점점 잊히는 정다운 우리말>에서
밤에 자는 잠이 ‘밤잠’이고, 낮에 자면 ‘낮잠’이 된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면 ‘아침잠(‘늦잠’이기도)’이고, 초저녁에 일찍 자면 ‘초저녁 잠(저녁잠)’이다. 봄날에 노곤하게 자는 잠은 ‘봄잠’인데, ‘가을잠’이라는 말은 없고, ‘여름잠’과 ‘겨울잠’은 동물에게만 허용된 잠이다. 깨워야 할 잠이 있는가 하면, 곯아떨어져야 할 잠이 있고, 나가떨어져야 할 잠도 있다. 우리는 무슨 잠이든 자긴 자야 한다._156쪽, <3장 • 국어학자도 놓치기 쉬운 우리말>에서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몰래 음식을 훔쳐 먹는 고양이’가 ‘도둑고양이’다. 준말은 ‘도둑괭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도둑고양이는 다 어디 갔는지 너도나도 입을 모아 ‘길고양이’란다. 길에 돌아다닌다고 길고양이인가? (실은 길에 돌아다닌다기보다 집 주위를 슬금슬금 숨어다니면서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도둑고양이’다.) 그렇다면 길에 돌아다니는 이른바 ‘유기견(遺棄犬)’은 ‘길개’인가? 불과 10여 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길고양이’가 한길을 차지해버린 데에는 신문과 방송의 선도적 부추김이 컸다. 마치 ‘길고양이’라고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덤벼든 결과이다._216쪽, <4장 • 일상에서 잘못 쓰기 쉬운 우리말>에서
우리의 시인들도 하나같이 옷이 몸에 ‘꽉 끼거’나 ‘꼭 낀’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아니 간곡한 호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호소들은 <너는 내 남자>의 그것과 함께 공허한 넋두리가 되고 말았다. 이는 전후좌우의 의미들 사이에 아무 역할도 해 주지 못하는 ‘끼다’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이 ‘끼다’의 자리에 ‘째다’를 들여앉혀 보길 바란다. ‘옷이나 신 따위가 몸이나 발에 조금 작은 듯하다’인 ‘째다’ 말이다. 하나도 놀랍지 않으리라. 그저 잠깐 한눈팔다 돌아온 것처럼.
따라서 ‘야구 캡 소녀’는 ‘꼭 째는 청바지’를 입어야 하고, ‘나무’들은 모두 몸에 ‘꽉 째는’ 나이테를 둘러야 하고, ‘젊은 여자’들도 ‘꼭 째는’ 옷을 입어야 한다. 또 ‘보폭이 평균 수치를 밑도는 남자’도 ‘꽉 째는’ 가죽바지를 입어야 하고, ‘부른 배를 감추려는 신부’도 ‘꽉 째는’ 드레스에 입이 ‘이만큼’ 나와야 하고, 김명수의 훈련화도 ‘꽉 째야’ 한다. ‘내 남자’ 만나러 거리에 나선 한혜진도 어김없이 ‘꽉 짼 청바지’를 입어야 하리라. ‘째다’는 ‘낙낙하다’의 반대 개념이 된다. ‘크기, 수효, 부피, 무게 따위가 조금 크거나 남음이 있다’가 ‘낙낙하다’이다. _313쪽, <5장 • 시골에서 결딴난 우리말3>에서
■ 차례
머리말 _7
1장 산과 들에서 잘못 피어난 우리말
만일 ‘열무꽃’을 보았다면 처녀 불알도 보았으리! _11
죽었다 깨더라도 ‘민들레 홀씨’는 없다 _20
벚나무가 꽃이 피면 ‘벚꽃나무’가 된다고? _29
아니! 고사리로 ‘이엉’을 엮는다고요? _35
금줄에 ‘솔가지’는 없다 _45
‘땡감’은 있어도 ‘땡감나무’는 없다 _57
2장 점점 잊히는 정다운 우리말
술래를 정하는 말 ‘고드래뽕’을 아십니까? _71
강원도에서는 ‘벙치매미’가 운다? _81
우리말 ‘다모토리’를 아십니까? _91
‘꾀복쟁이’가 아니라 ‘발가숭이’다 _103
이름을 모를 뿐 ‘이름 없는 꽃’이란 없다 _112
‘바둑머리’는 있어도 ‘까치머리’는 없다 _121
단추는 ‘달아’ 입어야 한다 _128
3장 국어학자도 놓치기 쉬운 우리말
‘산달을 앞둔’ 사람은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다 _137
‘토막잠’이라는 ‘잠’은 없다 _148
‘숨바꼭질’ 속에는 ‘술래잡기’가 숨어 있다 _159
‘지구의 반대편’은 도대체 어디인가? _170
‘논다니’와 놀아나면 ‘달첩’이 운다 _180
‘성긴 눈’은 있어도 ‘성긴 눈발’은 없다 _191
4장 일상에서 잘못 쓰기 쉬운 우리말
플랫폼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요? _203
‘도둑고양이’만 있고 ‘길고양이’는 없다 _216
당신이 ‘빈정 상하면’ 나는 ‘비위 상한다’ _228
라면은 ‘불지’ 않고 ‘붇기’만 한다 _239
이런 떡을할! ‘풍지박산이 났다’네 _249
‘난이도’는 있어도 ‘승부욕’은 없다 _258
‘살색’이 아니라 ‘살구색’입니다 _270
5장 시골에서 결딴난 우리말
‘천수답(天水畓)’은 있어도 ‘천답(天畓’)은 없다 _283
‘너와집’은 ‘돌기와집’이다 _296
벼를 ‘빻을’ 수는 없다 _305
‘홰’에는 닭이 오르고 ‘횃대’에는 옷이 걸린다 _317
‘숫병아리’가 아니라 ‘수평아리’다 _328
누구 ‘은주발’ 보신 분 있습니까? _337
‘햇콩’, ‘햇팥’이 아니라 ‘해콩’, ‘해팥’이다 _345
못생기기로 ‘도치’ 뺨칠 놈이 ‘삼세기’다 _353